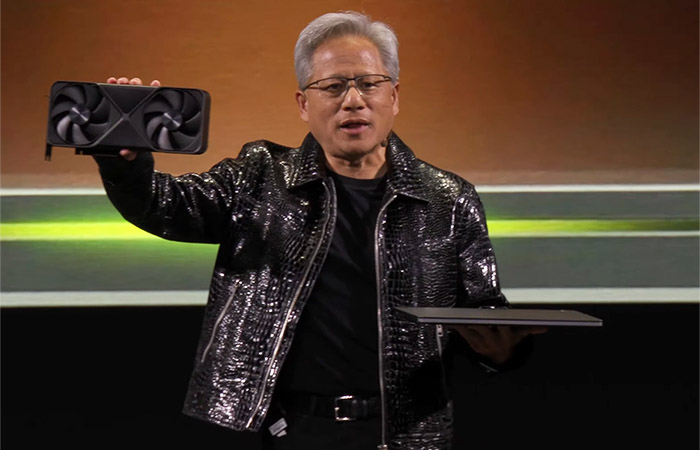사람 대신 인공 지능이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고, 스티어링을 조작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던 한 사람으로써 정작 자율 주행 자동차를 타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고백한다. 그래야만 짧은 시간이나마 처음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탔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번 CES는 자율 주행에 관한 목표나 기술에 대한 공언보다 실제 자율 주행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많다. 하지만 대충 연구소의 성취로 수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한된 참관자들에게 자율 주행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장을 따로 마련해 둔 것도 여럿이다. 그 중 엔비디아가 아우디와 함께 준비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시승했다.
 엔비디아 자율 주행 체험창을 찾은 시각은 저녁 6시. 이곳 라스베가스는 오후 5시만 되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6시쯤 완전히 어둠에 묻힌다. 엔비디아 자율 주행 시승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북쪽 골드 로트 주차장에 있다. 사실 대부분의 자율 주행 체험 장이 이쪽에 있는데, 주차장의 일부를 코스로 만든 것이라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코스를 보는 순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엔비디아 자율 주행 체험창을 찾은 시각은 저녁 6시. 이곳 라스베가스는 오후 5시만 되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6시쯤 완전히 어둠에 묻힌다. 엔비디아 자율 주행 시승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북쪽 골드 로트 주차장에 있다. 사실 대부분의 자율 주행 체험 장이 이쪽에 있는데, 주차장의 일부를 코스로 만든 것이라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코스를 보는 순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실제로 코스는 8자 형태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주행 구간이다. 딱 봐도 승차 시간은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만 짧은 코스라도 자동차가 달리는 몇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차선이 있는 일반 도로를 달릴 때, 차선이 사라진 흙길을 달릴 때, 주행 중 공사 표지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등이다. 모두 곡선 구간에 차 한 대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차선이다. 또한 저녁에 시승을 했기 때문에 야간 자율 주행의 능력도 덤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율 주행 체험전 부스에 들어가 자율 주행 관련 면책 문서에 사인을 했다. 코스에는 엔비디아가 발표한 BB8이 이날 마지막 주행을 하고 있었다. BB8은 엔비디아가 직접 테스트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일반 참관자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던 것이다. BB8이 주행을 마치자 주행 코스 바깥으로 나가고 아우디 Q7으로 선수가 교체됐다. 이 차는 지난 수요일 저녁 6시 30분(라스베가스 기준) CES 2017 키노트에서 아우디가 공개했던 그 차다. 고작 나흘 학습한 채 자율 주행 시험에 뛰어든 바로 그 차가 나온 것이다.
자율 주행 체험전 부스에 들어가 자율 주행 관련 면책 문서에 사인을 했다. 코스에는 엔비디아가 발표한 BB8이 이날 마지막 주행을 하고 있었다. BB8은 엔비디아가 직접 테스트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일반 참관자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던 것이다. BB8이 주행을 마치자 주행 코스 바깥으로 나가고 아우디 Q7으로 선수가 교체됐다. 이 차는 지난 수요일 저녁 6시 30분(라스베가스 기준) CES 2017 키노트에서 아우디가 공개했던 그 차다. 고작 나흘 학습한 채 자율 주행 시험에 뛰어든 바로 그 차가 나온 것이다.
안전을 위해 몇 바퀴 테스트 주행을 한 뒤 시승을 해도 된다는 사인이 나왔다. 대기 부스에서 나와 아우디 Q7으로 다가가니 차 자체의 외형적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인다. 특별히 더 많은 센서를 단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 우리는 모두 뒷자리에 탑승했다. 보조석 자리에는 이 차의 체험 주행을 보조하는 연구원이 탑승해 있고, 운전석은 텅빈 상태였다.
일단 체험자들이 차에 오르자 차는 서서히 출발했다. 시험 주행이라 최고 속도가 아주 빠르게 느껴질 만큼은 아니다. 계기판 속도계는 두 자리 수를 표시한 적이 거의 없는 속도로 나아갔다. 그래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에 앉은 터라 안심할 수는 없는 법. 출발한 뒤 곧바로 직선에서 곡선 구간에 접어들자 스티어링 휠이 매우 빠르게 돌라간다. 곡선 구간이 의외로 많이 휘어 있는 터라 스티어링 휠의 회전 속도가 빠르다. 연속된 곡선 구간을 왼쪽으로 휙, 오른쪽으로 휙 돌리며 물 흐르듯이 빠져나간다.
곡선 구간을 지나 차선이 없는 울퉁불퉁한 흙길 구간도 잘 빠져나갔다. 다시 같은 코스를 한바퀴 돈 뒤 이번에는 갑자기 중간 구간에 공사중 돌아가는 네온 사인을 켜 놓은 간판이 등장했다. 돌발 상황을 만든 것이다. 곡선 코스를 돌던 아우디 Q7은 장애물을 만나자 스티어링 휠을 풀지 않고 그 옆길로 그대로 빠져나갔다. 역시 차선이 아니라 콘으로 임시로 만든 도로였는데,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
돌발 상황까지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주행으로 돌아온 뒤 차는 이내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멈췄다. 달린 시간이 짧고 좀더 다양한 상황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 능력을 가볍게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나쁘진 않았다.
다만 테스트 차에서 내리기 전 자동차용 컴퓨터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PX2를 내장한 것 외에 별도의 센서가 보이지 않았기에 앞쪽의 연구원에게 라이다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런데 이 차에 라이다는 없고 한 대의 카메라로만 주행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첫 학습을 시작할 당시 3대의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한 뒤 실제 주행에는 하나만 썼다는 것이다.
 자율 주행 차량은 앞쪽 뿐만 아니라 전방위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카메라 또는 라이다 같은 센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율 주행 체험 부스에 있던 엔비디아의 자율 주행 개발자는 라이다가 있으면 좋지만, 더 많은 카메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다만 이미지 센서의 화소수가 너무 작으면 잡음이 섞여 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 수 있어 200만 화소 카메라 센서를 아우디 Q7에서 썼다고 설명했다.
자율 주행 차량은 앞쪽 뿐만 아니라 전방위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카메라 또는 라이다 같은 센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율 주행 체험 부스에 있던 엔비디아의 자율 주행 개발자는 라이다가 있으면 좋지만, 더 많은 카메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다만 이미지 센서의 화소수가 너무 작으면 잡음이 섞여 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 수 있어 200만 화소 카메라 센서를 아우디 Q7에서 썼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 체험 주행은 말 그대로 체험이라 아직 안전하거나 믿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충분한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상용화 단계로 가려면 기술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CES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 자율차의 출시 시기를 2020년으로 삼은 것도 어쩌면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단지 이번 자율 주행차를 타면서 한 가지는 좀더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듯하다. 자율 주행차의 인공지능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심리적 장벽에 대한 문제다. 물론 시승했던 자율 주행차는 사고도 없었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주행 시간도 ‘이게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았다. 동영상 녹화 시간을 보니 4분 남짓. 때문에 시승 중에는 별로 걱정을 했던 것도 아니다.
단지 이번 자율 주행차를 타면서 한 가지는 좀더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듯하다. 자율 주행차의 인공지능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심리적 장벽에 대한 문제다. 물론 시승했던 자율 주행차는 사고도 없었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주행 시간도 ‘이게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았다. 동영상 녹화 시간을 보니 4분 남짓. 때문에 시승 중에는 별로 걱정을 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자유 주행차를 시승한 이후 상용화가 된 자율 주행차를 타게 됐을 때를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자율 주행 시승처럼 뒷자리에 앉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전방의 상황을 집중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인공지능을 믿을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아직은 믿음보다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핸들을 놓은 채 운명을 거는 이들도 있을 테지만, 그로 인해 불거진 문제점들이 자율 주행에 대한 불신도 함께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짧은 시승에서 지난 해에 비해 기술의 진전이 있는 점은 인정하고 싶다. 단지 미래의 자율 운전을 곱씹어 본다면 기계의 정직성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자율 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인공 지능의 기계적 정직함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준비와 계기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어쩌면 인공지능이 운전을 보조하는 코-드라이버도 그 개념에서 좋은 접근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