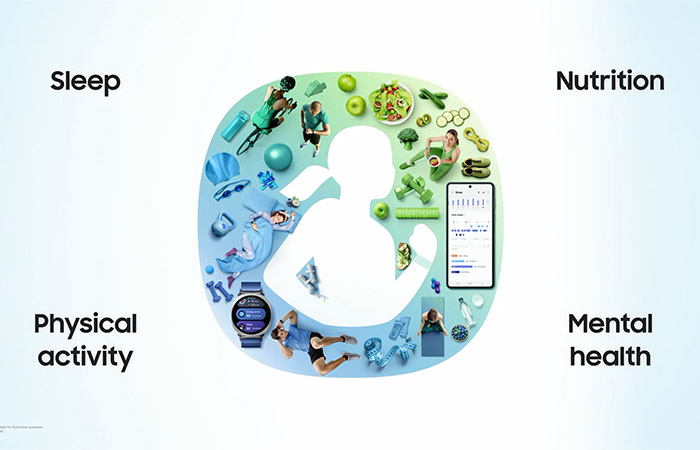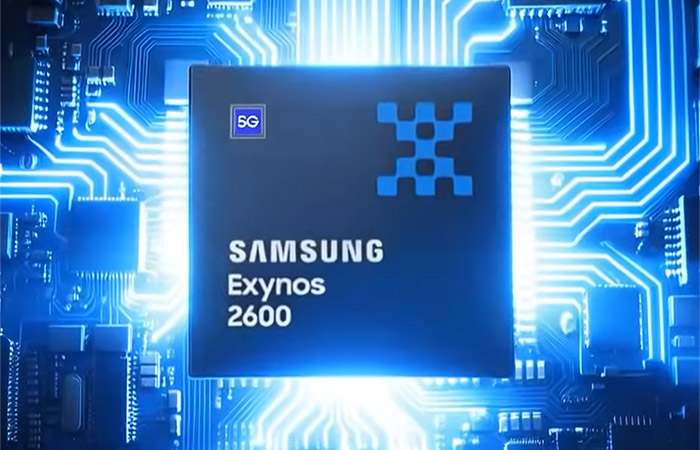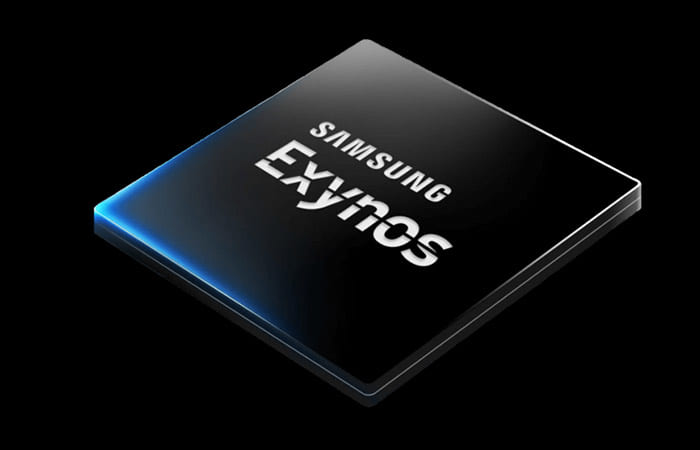‘하드웨어는 바뀌었는데, 티나지 않은 걸?’
언팩이 끝나고 체험존의 갤럭시 S9을 손에 쥔 순간 첫 인상이 그랬다.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이라 매력을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닌가 싶어도 언팩 내내 겉돌던 메시지의 명확한 답을 이 자리에서 찾지 못할 거라는 확신 하나 만은 분명해졌다. 어쩌면 그 느낌은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너무 높았던 내 기대에 대한 배신이라면 배신일 것이다.
사실 나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묘한 고정관념을 하나 갖고 있다. 갤럭시 S는 늘 하드웨어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하는 트렌드 세터라는 점이다. 펜의 이용자 경험을 앞세운 노트와 확실히 다른 강력함을 무기로 시대를 좀더 앞서가거나 동시대에서 다름을 보여줬을 때 고착화된 이미지였다. 성능에 대한 이미지는 갤럭시 S2, 만듦새는 갤럭시 S3, S6쯤 일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대로지만, 그렇다고 예전 같은 파괴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상향 평준화된 하드웨어로 스마트폰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트렌드 세터의 역할을 대신할 제품들이 쏟아진 이후 갤럭시 S 시리즈가 정체성의 길을 잃고 있는 듯한 막연한 생각이 들 뿐이었다. 물론 이것은 시장에서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과 별개다. 그저 잘 만든 제품으로써 시장에 팔리는 것과 이야기할 만한 제품으로 평가는 다른 부분이라서다.
내 기대는 바로 이 막연한 안개로 짙어지는 갤럭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온 듯하다. 강력한 성능의 트렌드 세터로써 시장의 흐름을 이끌 만한 능력을 갤럭시 S9이 보여줄 것인가다. 부품과 만듦새, 그리고 기술 트렌드를 종합한 결과물을 다시 갤럭시 S9에서 기대해도 될 것인지 말이다.
물론 기능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사실 놀라운 점도 있고 재미도 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이들이 그 재주를 다뤄 보고 공유한 경험을 찾아본 이라면 흥미를 느낄 부분도 적잖았을 게다. 특히 카메라는 즐길 거리는 넉넉하다. 몇 가지만 정리해보자. 갤럭시 노트8에도 쓰였던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가 특별히 더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처리 성능을 믿고 넣은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한다. 비록 최초는 아니어도 초당 960 프레임으로 촬영한 720P 영상을 아주 느리게 볼 수 있는 슈퍼 슬로 모션은 그 자체로 놀이다. 빠른 피사체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해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되돌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AR 이모지도 재밌는 기능이다. 이용자의 얼굴을 곧바로 3D 이모지 캐릭터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얼굴을 띄운 채 화면을 보며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 캐릭터가 그대로 따라한다. 다만 아이폰 X의 애니모지에 비하면 프레임이 떨어져 부자연스럽다. 무엇보다 AR 이모지로 만든 아바타는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못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얼굴을 분석하는 잔인한 소프트웨어는 현실의 얼굴이 디지털 세상에서 꾸며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몇 번을 반복해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똑같은 얼굴의 아바타를 만든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기술의 우수함을 인정하더라도 가볍게 웃고 즐기는 기쁨을 주는 기술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하라.
F1.5와 F2.4로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조리개 옵션을 고를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실제로 이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뒤쪽 카메라의 조리개를 물리적으로 열고 닫는다. 다만 100룩스 이상에서 F2.4로 고정되고, 그 이하에서 F1.5로 조리개를 연다. 만약 밝은 환경에서 F1.5를 쓰고 싶다면 프로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수동 모드 한번 켜본 경험 없이 무작정 사진을 찍는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AKG에서 튜닝한 스테레오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를 결합한 덕분에 영화를 볼 때도 이어폰 없이 듣는 사운드가 더 풍부해졌다. 가로 모드 게임을 하다가 홈으로 돌아갈 때 폰을 90도 돌려서 잡지 않도록 가로 홈 화면 모드를 적용했고, 이 상태에서도 두 개의 콘텐츠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세로보다 좀더 유연하게 보인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위한 데스크톱 PC 모드인 덱스의 인터페이스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덱스 모드에서 갤럭시 S9의 화면을 터치 패드 모드로 작동하게 만든 아이디어는 좋다.
이처럼 갤럭시 S9의 기능별 완성도는 뛰어나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잘 담아낸 것에서 모든 이야기는 끝난다. 완성도만 따지면 갤럭시 S9의 평가가 결코 박하게 나올 리 없는 건 분명하나 갤럭시 S9를 말할 때 ‘최고의 폰’ 같은 찬사의 언어를 쉽게 꺼내기 힘들다. 여기 저기 흩어진 수많은 기능과 브랜드를 하나의 바디에 모은 갤럭시 S9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상향 평준화 시대에서 하드웨어의 가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새로운 기능과 경험에 대해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삼성도 갤럭시 S9에 그 차별성을 두려 애썼을 게다. 하지만 어디에서 다름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재미있는 기능은 들어갔는데 그것이 하드웨어의 능력을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이 하드웨어이기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갤럭시 S9의 기능 대부분은 반드시 이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다. 갤럭시 S9에 쌍끌이해 넣은 재주들은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나는 갤럭시 S9이라는 진보한 하드웨어에 걸맞은 재능을 기대했다. 인공 지능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빅스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빅스비는 여전히 말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 언어 번역이나 사물 인식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서비스의 일부일 뿐 갤럭시 S9 전체를 관통하는 인공 지능의 재능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장치 자체의 기계 학습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도,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을 찾거나 문자를 보내는 재주는 이전에도 있었고 쓰면 쓸수록 나아진다고 하나,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의 설정이나 품질 개선, 시스템의 전력 소모를 최적화하기 위한 신경망 코어 같은 보완이나 프로세서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차별성에 기인한 능력은 갤럭시 S9에서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